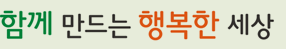언론봉사단
기초생활 수급자 알아보기
우리는 평소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러워하는 패턴이 있다
모든 것을 알고 나면 현재의 생활이 편하고 즐거울 수가 있다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에 여러 문헌에서 참고하여 올려 보았다
나라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600원[46],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kg 1만 900원[47][48]이라는 싼 가격에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카드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 시중 흰쌀 최저가의 10%(생계, 의료급여), 50%(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이다.
나라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유통하지 않는다.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50]을 적용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준다.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해마다 문화누리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해준다.
카드는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보통 2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돈은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
2017년도까지 5만원이었다가 매년 1만원씩 늘어 2023년 기준 11만원이다.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 것 외에도 네이버 웹툰 캐시 결제, 넷플릭스 결제가 가능하며 비행기와 기차표 결제가 가능할 만큼 매우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주거: LH나 SH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오는 한 편 일반 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어서 당첨확률이 높다.
## 그리고 2021년 드디어 생계급여에 한해서 연 소득이 1억이 넘지 않는 자녀만 있다면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에도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3명의 자녀가 각각 9,000만원의 연 소득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명의 자녀가 백수이고 1명의 자녀가 연 소득이 1억이 넘으면 부양의무가 100% 생겨서 컷오프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함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부양의무자가 강화된 부분으로 시집간 딸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100% 반영된다는 점.
혜택: 정부에서 하는 웬만한 지원사업의 0순위는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고 1순위가 차상 위 계층이다. 그리고 이 혜택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시대에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쌀과 부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건 지자체별 정책 및 재정, 외부 후원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쟁대비용으로 3년간 비축해둔 나라미로 한국군병영식에 나오는 쌀과 똑같은 쌀이다.
쌀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매달 구입할 수 있다.(보장가구원 당 1포만 가능)
가장 중요한 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정도인데 3인 가구에서 한 달 150만원을 벌면 모든 생활보호가 중단된다.
3인 가구 월 소득 150만원이면 집이 전세가 아닌 이상 말 그대로 빠듯한 수입인데 그나마도 아껴쓰고 아껴쓴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 수는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최대 4인 가족 약 132만원, 3인 가족 약 107만원의 현금급여(2015년 12월 18일 기준 - 4인가구 기준 월 1,182,309원, 2인가구 기준 월 744,855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료보험비가 지출되지 않으니 나머지로 생활을 하면 된다. 각종 요금 감면이 있긴 한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고 저 돈으로 살면 된다.
도저히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면 수급자로 사는 것도 좋다.
임금칠 기자